정관수술 후 14년 만에 임신? 남성 불임의 진실과 최신 치료법
TV조선의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한 부부의 사연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편이 14년 전 정관수술을 받았음에도 아내가 임신 38주차에 접어든 놀라운 상황이었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정관수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정관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정자가 배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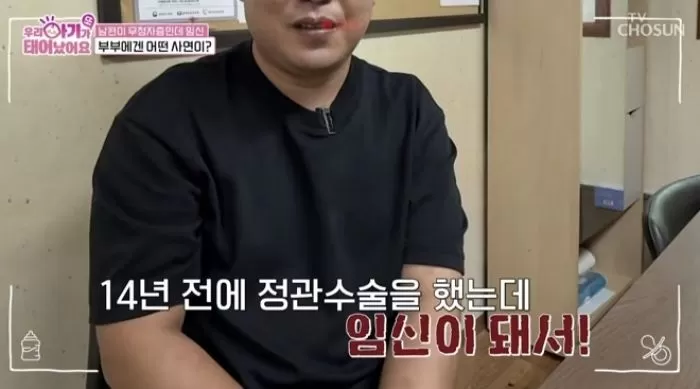 TV조선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TV조선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인체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인해 절단되었던 정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술 후 몇 년 이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사례처럼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정자증의 유형과 치료 가능성
무정자증은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첫째는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고환에서 정자는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배출 통로가 막혀 정자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관수술로 인한 무정자증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고환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정자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폐쇄성 무정자증은 수술적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힌 정로를 수술로 개통하면 정액에 정자가 섞여 나올 확률이 70%에 달하는데요. 부고환관을 찾아 정관과 연결하는 미세수술이나, 막힌 사정관을 교정하는 정관부고환문합술 등을 통해 50~70%의 확률로 정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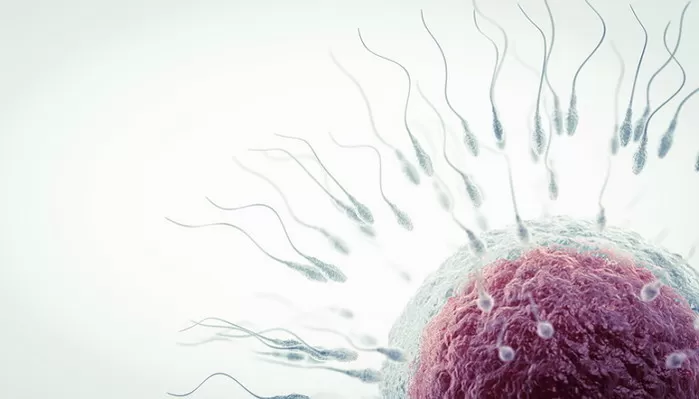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비폐쇄성 무정자증은 치료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정자 생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클라이펠터 증후군, Y염색체 결손, 세르톨리 세포 유일 증후군 등이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항암치료, 정계정맥류, 고환염, 잠복 고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 불임 환자 증가와 첨단 치료법의 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환자는 7만 9251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24.6% 증가했습니다.
불임으로 진료받는 남성은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19년 7만 9251명으로 5년 동안 약 47% 급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의 경우, 난임 커플 중 남성에게 주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최대 40%를 차지하며, 이 중 최대 10%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정자증 치료의 최후 방법으로는 '고환 내 정자 채취술(TESE)'이 있습니다. 이는 고환 조직을 추출해 고배율 현미경으로 정자를 찾아내 인공수정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남성 불임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컬럼비아대 난임센터는 18년간 임신에 실패했던 무정자증 부부를 AI 시스템으로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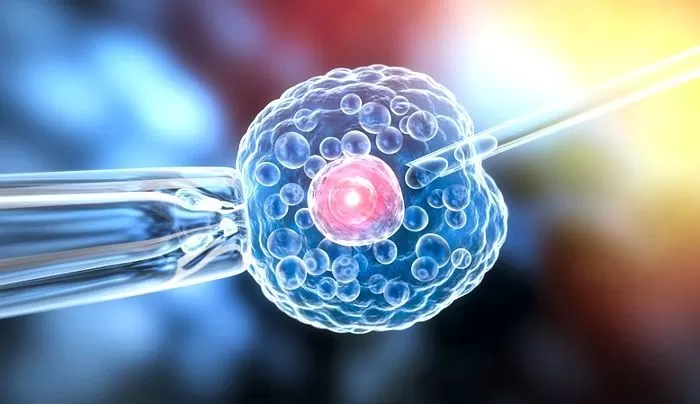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TAR'(Sperm Tracking and Recovery)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정액 샘플을 특수 칩에 올려놓고 고속 카메라와 AI로 800만개 이상의 이미지를 분석해 정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개발자인 제브 윌리엄스 센터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1000개의 건초 더미에서 흩어져 있는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며 "1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고, 해로운 레이저나 오염 없이 수정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3000달러(약 409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컬럼비아대 난임센터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개발팀은 연구 성과를 공개해 다른 센터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