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급증, 작년 처음으로 4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가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만 3000명 중 남성은 4만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5.6%(4872명)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 수급자가 9만1000명(68.4%)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녀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36.1%, 남성은 52.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2만7000명으로 증가했는데 2015년과 비교해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여성 고용률 상승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령별로는 30대(61.5%), 40대(59.2%), 50대(58.0%) 순으로 맞벌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로 2015년 47.2%에 비해 11.3%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도 53.2%로 2015년 38.1%보다 15.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2015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73.5%로 같은 기간 13.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76.8%로 0.9%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이 58.9%, 여성이 55.1%로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높은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9%로 2015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가구 형태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우리 사회의 가구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10년 만에 1.5배 증가했습니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가 여성 1인 가구는 60대(18.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149만1000 가구로 일반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모는 30대(37.1%), 미혼부는 40대(40.0%)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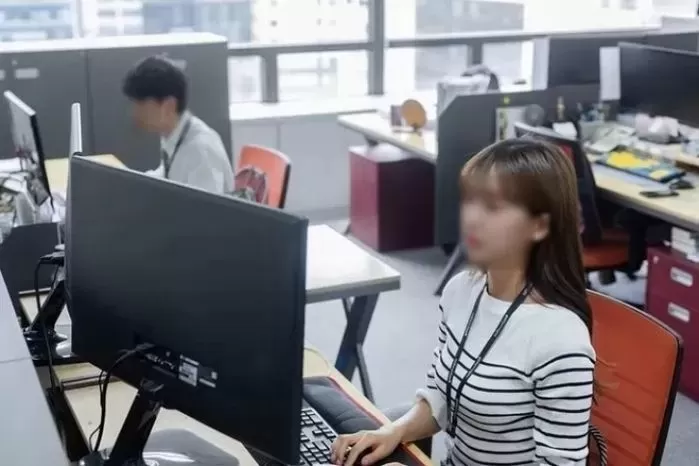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6.3%로 14.2%포인트 증가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4.6%에 달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5.4%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13~19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형태, 경력단절, 일생활 균형, 대표성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상을 세심히 살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